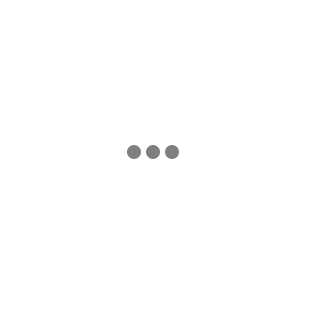<변두리 사진 보고서> 제2호
*변두리 사진 보고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진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루는 연재물입니다.
‘취업사진’이란 허상
증명사진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들
글 이기원
포토닷 2015년 3월호
사진이 발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크게는 보도사진부터, 작게는 개개인의 신분증 속 증명사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진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기록해두고, 증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어떤 사진이 증명해주는 것은 어떤 사건(보도), 사물(광고), 인물(증명사진) 등 시각 영역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식별도구로서의 사진
사진이 ‘식별도구’로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871년 파리 코뮌 진압 이후 파리시 당국이 바리케이드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 코뮌 가담자들을 색출한 사건(1)이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파리 경시청 신원확인부 경사인 알퐁스 베르티옹(Alphonse Bertillon, 1853~1914)이 범죄자 식별을 위해 확립한 기술체계인 ‘베르티오나지’(bertillonnage)(2)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11개 신체부위의 측정치(키, 앉은 키, 머리둘레, 손가락 길이, 발길이 등)로 개인을 식별하는 신체측정 기술을 고안해 사진을 분석/분류하여 식별도구로서의 사진의 기반을 마련했고, 식별사진의 촬영방식이나 기준까지 확립했다.(3)
물론 신원확인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이제 지문이나 DNA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 베르티옹의 식별사진처럼 여러 신체부위를 다각도에서 촬영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가 제시했던 몇가지 기준, 즉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단색조의 배경, 자연스러운 표정 등은 오늘날까지도 증명사진의 규격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증명사진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간편한 식별도구로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의 등장으로 인해 그 기록성/신뢰성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디지털 사진이 증명사진에 미친 영향
과거 초상사진이 가지는 지위는 절대적이었다. 사진이 없던 시대를 살아오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치 거울 앞에 처음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사람처럼,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걸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초상사진의 절대적 지위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디지털 사진이 등장하면서부터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그와 동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본인 입맛에 따라 보정/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전까지 그 어떤 화장품이나 미용기술로도 해낼 수 없던,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화한 사람의 얼굴(신체)을 가져다주었다. 덕분에 누구나 백옥같이 하얗고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주름이나 처진 볼살, 뭉툭한 턱선부터 탈모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외모 콤플렉스를 (적어도 사진 속에서는)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불어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얼굴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되면서 얼굴을 통한 신원확인의 신뢰성, 다시 말해 증명사진이 식별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증명사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사진분야(보도, 자료, 증거 등)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사진이라는 매체가 안팎으로 점점 그 객관성을 잃어감에 따라 현대인들은 더 이상 사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진발’, ‘뽀샵(포토샵)발’ 등과 같은 용어의 탄생이다. 사람들이 성형미인을 ‘진실한 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사진 속의 매끈한 얼굴을 곧이곧대로 ‘진실된 기록’이라 믿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현대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진을 보더라도 그것이 포토샵을 통해 보정/조작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진에 보정을 가하는 것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덧칠하며 고치는 것과 같이 너무나 당연한 사진 생산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에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로
결국 지금의 증명사진은 시각적인 면에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의미와 역할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신원(얼굴)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기보다는 각자의 욕망과 취향, 사회의 시선을 투영하는 기능까지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바라보는 나’에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의 표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덕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사진에서만큼은 자신의 모습이 더 갸름하고, 더 매끈하고, 더 또렷하게 나오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망이 극대화된 또 다른 결과물이 바로 ‘취업사진’이다.
한국사회를 뒤덮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은 과거에는 그저 신원확인용으로만 작용했던 증명사진이 이제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서류심사의 합격/불합격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4)라고 생각하게끔 이르렀다. 사진 자체의 규격이나 규정과는 별개로, 피사체(인물)의 인상과 느낌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서 기존 증명사진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취업용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취업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진관에서는 메이크업과 헤어, 의상까지 오로지 취업에 맞춘 스타일로 제공하고, 구직자의 지원 직종이나 기업별 성향에 따라 ‘합격을 부르는 증명사진’ 스타일이 따로 존재한다고 홍보한다. 이는 한편으로 구직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일반 증명사진에 비해 많은 비용(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을 치르고서라도 취업용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이력서용 사진에 대한 구직자의 불안감은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와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의 ‘이력서 사진 평가’라는 게시판(5)을 통해 드러난다. 이들은 각자의 증명사진이 지원 직무나 기업 성향에 부합하는지 평가를 부탁하고 조언하며, 더 나아가 사진을 고쳐달라는 사진 보정 요구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외모지상주의에 떠넘기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맞춤형 증명사진은 가능한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과연 증명사진을 통해 한 개인의 성품이나 인상을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각 직업군이나 기업마다 그에 적합한 사진 스타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른바 취업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진관에서는 ‘업/직종별 선호 이미지표’까지 만들어 구직자의 지원 업종에 따라 차별화된 사진을 촬영한다고 홍보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영업 직종엔 대인친화적 이미지가, 사무/디자인/은행 등의 직종에는 신뢰감, 정확성이 느껴지는 이미지, 생산/건설/공무원 지망생에게는 책임감과 근면성이 묻어나는 이미지의 사진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단 한 장의 규격화된 인물사진에 이러한 가치(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을까?
사진은 단지 렌즈를 통해 비친 상을 재현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배경지식과 같은 외부요소를 걷어내고 한 장의 사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사진의 표면의 조형적 요소밖에 없다. 이에 대해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역시 “어떤 사진은 그것의 지시 대상과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6)한다. 이처럼 어떤 사진이 스스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프레임 안의 피사체가 촬영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렇기에 증명사진 역시 실제 인물과의 대조를 통한 식별의 기능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단 한 장의 규격화된 초상사진에 신뢰감이나 책임감과 같은 무형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취업사진은 허상에 불과하다. 면접관이 증명사진을 통해 어떤 인상(감정)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이력서에 사진과 함께 쓰여 있는 정보와 면접관 개인의 경험과 배경지식, 선입견 등이 뒤섞여 만들어지는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과 정확성을 가지는가는 사진 자체의 요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진 자체에서 신뢰감, 책임감, 근면함 등의 요소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마치 고전주의 초상화가 그랬던 것처럼 도상학적 상징성을 가지는 소품/기호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서거나 이를 포토샵으로 그려 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도판 캡션
(1) : 알퐁스 베르티옹, 인체측정사진, 파리 경시청, 1885년경
(2), (3) : 한 취업 정보 커뮤니티의 ‘이력서 사진 평가’ 게시판 캡처, 사실 이들의 사진만 놓고 보면 도대체 어떤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각주
(1) : 김경미, ‘증명사진을 통해 본 초상사진 특성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쪽
(2) : “‘베르티오나지’는 베르티옹이 개발한 신체측정, 언어묘사, 사진 등 여러가지 식별기술들의 총합을 지칭한다.” 박상우, ‘사진, 닮음, 식별 : 베르티옹 사진 연구’, 한국사진학회지(통권20호), 2009, 135쪽, 각주 5
(3) : 앞의 논문, 136쪽
(4) :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482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이 서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83.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장종호, ‘구직자 84% ‘이력서 사진도 스펙’’, 스포츠조선, 2014년 10월12일, 서울
(5) : 한 취업 정보 커뮤니티의 ‘이력서 사진 평가’ 게시판 캡처, 도판2 참조.
(6) : 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조광희 옮김, 열화당, 1986, 1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