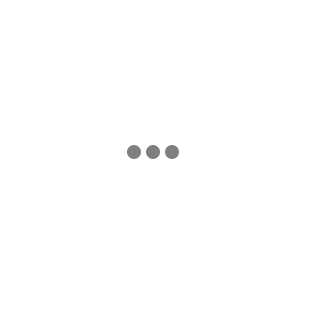박진영 강홍구 작가의 작품이 공존하는 ‘2부 : 기억’ 전시전경
이미 사라지고 없는 도시를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 : 강홍구 박진영 <우리가 알던 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5.5.19 - 11. 15
포토닷 2015년 8월호
글 이기원
<우리가 알던 도시>전을 축약하는 키워드인 도시, 재개발, 재난은 사실 사진가들이 가장 많이 다뤄온 너무나 익숙한 소재다. 하지만 강홍구와 박진영 두 작가는 이처럼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도시’라는 소재를 각자의 시선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오며 그저 ‘이미 사라지고 없는 도시’를 추억하기보다는 도시의 잔해와 흔적에 비친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도시’를 이야기한다. 강홍구가 찍은 부산 산동네와 재개발 지역의 풍경과 박진영이 후쿠시마에서 기록한 사진은 그저 오래된 도시마을 및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쓰나미와 방사능 누출이라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강홍구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가파른 산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으며,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물음을 던지며 박진영은 불타지도, 무너져 내리지도 않은 후쿠시마의 거리가 어떻게 아무도 살지 않는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변했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고민한다.
박진영의 작품은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작가가 사진 안에 크게 개입할 틈이 없는 사진이다. 그는 그저 자신이 발견한 장면을 묵묵히 카메라로 옮겨 적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전통적 다큐멘터리’의 형식과 태도를 간직한 마지막 세대의 작가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다큐멘터리가 형식보다는 표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박진영은 그의 선배 사진가들과 달리, 작품의 영역을 ‘프레임’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장하면서 자신의 사진이 갖는 형식의 약점을 장점으로 역전시킨다.
전시장에 들어서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간은 박진영 작가의 ‘Moving Nuclear’, ‘2PM in Fukushima’, ‘사진의 길’ 등의 시리즈로 꾸려진 ‘1부 : 방문’이다. 작가는 자신의 전시공간을 작품을 거는 장소로만 인식하지 않고, 작품 바깥의 요소들을 활용해 전시공간 자체를 자신의 작품으로 끌어들인다. 배 안의 구멍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기록한 ‘Moving Nuclear’ 시리즈가 배치된 공간은 그저 작품을 보기 좋게 걸어두는 화이트큐브가 아니라, 작가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잡은 해양경찰 순시선 내부의 풍경과 분위기를 재현하는 설치미술로 작동한다. 마치 배의 내부를 걷는 것처럼 어두운 조명, 미세한 곡선으로 굽이진 복도를 비롯해 마치 실제 배의 구조물을 가져다 놓은 듯한 금속제 프레임 그리고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미술관의 것이 아닌’ 어떤 냄새까지 박진영은 전시장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며 관람객에게 그저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을 살펴보는 ‘감상자’가 아닌, 작가가 경험했던 어떤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은 ‘Moving Nuclear’뿐 아니라 나머지 작업들이 놓인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2PM in Fukushima’ 시리즈는 거리의 풍경을 작가 카메라로 본 비율에 맞춰 인화해 관람객에게 마치 후쿠시마의 어떤 사거리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앞서 밝혔듯 그의 작품이 ‘작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1부 : 방문’의 공간에서 박진영의 작품들은 ‘액자에 들어간 사진’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작가가 경험한 공간과 시선으로 연결되는 ‘창문’에 가깝다. 이는 한편 그동안 사진이 ‘전시’의 형태로 선보일 때 전반적으로 노출됐던 약점-공간을 점유하지 못하고 그저 액자 안에서만 존재하는 문제-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한편 강홍구 작가의 사진은 ‘미키네 집’이나 ‘수련자’와 같은 오브제를 등장시키거나 사진을 이어붙인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인화지에 채색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작가가 사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얼핏 재개발 지역을 소재 삼아 그저 개인적인 감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각각의 작품이 지시하는 맥락에 있어서는 엄연히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기능한다.
박진영, ‘Moving Nuclear’ 전시전경
강홍구의 공간인 ‘3부 : 배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치 각각의 작품이 퍼즐 조각처럼 배치되어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을 이루는 부산 산동네 풍경이다. 이는 박진영의 사례처럼 공간을 장악해 공간의 분위기를 점유한다기보다는 마치 어떤 전망대에 올라 마주한 풍경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에 가깝다. 하지만 그것은 작가도, 작가의 카메라도 실제로 보지 못한 ‘만들어진’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현실적인 비현실 공간’을 보여주는 각각의 작품이 맞물려 하나의 커다란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 흥미롭다.
하지만 이는 배치된 작품들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읽히면서, 결국 관객이 이들 작품을 대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치된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홍구의 전시공간에서 작품이 차지하는 영역은 액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사진과 회화가 해왔던 방식에 머문다. 이에 작가는 여기서 드러나는 약점을 전시장 곳곳에 숨겨둔 텍스트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그것은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의 나레이션처럼 관람객에게 작가의 의도를 풀어갈 실마리로 작용하고, 사진으로 다 할 수 없는 오롯한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중에서도 “가까이 다가서면 부딪치고, 멀리 가면 남의 일이 되고, 그래서 구경꾼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라는 문장은 강홍구가 자신의 사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의 작업을 축약하는 핵심적인 문장으로 자리한다.
사실 2인전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공간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작가의 작품이 서로 엮이는 공간인 ‘2부 :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 각자의 공간인 1부와 3부가 그들이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면, ‘2부 : 기억’은 이들이 각자의 사진과 피사체를 다루는 방식에서의 차이점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강홍구의 ‘Fish with Landscape-제임스 딘’과 박진영의 ‘고상한 취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죽은 생선의 존재가 바로 그것인데, 박진영의 생선은 작가의 시선을 끌어 ‘발견된’ 피사체라면, 강홍구의 생선은 작가의 필요에 의해 ‘불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진영의 생선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관객의 몫이 되는, 전통적인 사진의 방식을 따른다. 반면 강홍구의 생선은 마치 고전회화의 상징물(도상)처럼 작동하며 해석과 판단의 근거가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던 도시>전은 얼핏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2인전 기획 <타이틀 매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도시’라는 소재만을 공유하는 각기 다른 두 중견작가의 조합으로 비춰진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다큐멘터리’를 해온 가장 젊은 중견작가라 할 수 있는 박진영과 중견작가 중 최고참이지만 작업 자체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 강홍구의 조합으로 한국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각기 다른 두 지점과 그 사이의 간극을 이야기한다. 결국 이번 전시는 표면적으로 ‘도시’라는 소재를 공통분모로 한 두 작가의 작업을 펼쳐놓은 전시로 보이지만, 강홍구와 박진영이라는 두 작가가 한국 사진에서 갖는 상이한 위치와 작업방식을 통해 ‘다큐멘터리’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두 작가를 조명한다. 결국 이번 전시는 1+1이 2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보다는 각각의 1이 서로 얼마나 다른 1인지를 분석하는 맥락으로 자리한다.
강홍구의 전시공간인 ‘3부 : 배회’ 전시전경
사진제공 : 국립현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