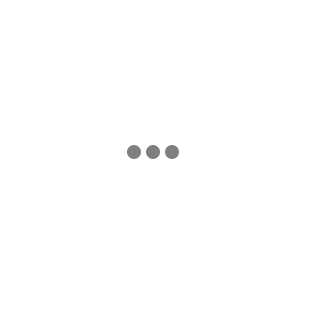아카이브가 미술관으로 옮겨왔을 때
일민미술관,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 14. 6. 26 - 9. 21
아트인컬처 2014 뉴비전미술평론상 응모 원고
아트인컬처 2014년 9월호 게재
글 이기원
1980~90년대생에게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간접 경험으로는 너무 먼 이야기이며, 고등학교 근현대사 수업을 통해 알아가기에는 너무 가까운 과거이기에 모호한 시간으로 느껴진다. 일민미술관의 이번 기획전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는 인문학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재구성한 아카이브 전시로서, 이들 소장품들은 역사책이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연대기순의 구성에서 벗어나 크게 세가지 주제에 따라 세심하게 배치되어 전시장 거닐다 보면 마치 그 시대를 살아온 누군가의 기억 속을 굽어보는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든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전시는 인문학 박물관의 소장품을 단지 미술관으로 옮겨온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아카이브 자체를 하나의 예술 언어로 재해석한다.
이는 전시의 첫 번째 섹션 ‘모더니티의 평행우주’에서 1930년대 초반생 서울 토박이와 1960대 초반생 농촌 출신이라는 가상이지만 실재했을 두 인물로 구체화하여 소장품과 관객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또한 <스무개의 텍스트>에서는 관객이 직접 과거의 글들을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게 하여 이번 전시 전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두 번째 섹션인 ‘인간의 생산’에서는 1980년대 이전의 교육 자료들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인간상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자료들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과 관객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정의 경험과 비교하며 우리 사회의 인간상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데, 전시되는 그림 자료나 도표들은 조형적으로도 흥미롭지만 하나의 리서치 작업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전시의 세번째 단계인 ‘이상한 거울들’은 당시의 보도사진, 잡지 등과 같은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마치 그 제목처럼 이상한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당대의 어딘가 왜곡된 사회상, 다시 말해 정부와 권력기관 혹은 언론의 시각에서 그들이 ‘보고싶은대로’의 사회상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전시는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재배치, 재해석하며 그것에 예술적 영속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데, 얼핏 박물관과 미술관은밖 비슷한 목적의 공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분명 미술관에 들어가는 예술작품과, 박물관의 자료 혹은 유물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정해진 맥락과 순서에 따라 배열되며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의미나 가치가 무력화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 자료들도 그것이 박물관 바깥의 누군가의 방 안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단지 오래된 책이나 누군가의 학창시절 과제물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처럼 자료나 기록물은 누군가가 그것을 꺼내보기 전까지는 잠들어있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소장품이 미술관 안으로, '전시'의 형태로 소개되는 순간 이들은 하나의 작품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생명력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게 된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달리 읽히기도 하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 재조명되기도 하는 가능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관객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미술관의 예술작품과 박물관의 소장품 사이의 경계가 형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모더니티의 평행우주’ 섹션에 놓인 <김삼철의 자화상>과 같은 자료들은 단지 미술시간에 그렸던 오래된 그림이 아니라 김삼철씨가 살아온 한국의 사회상이 반영된 미학적 오브제로써 작동한다. 이는 그간 어떤 아카이브나 박물관의 소장 자료로만 존재했던 사물들에게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카이브 자료의 이러한 '작품화'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진이 단순한 기록과 재현의 도구에서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게 된 과정과 닮아 있다. 물론 현대미술에서 매체에 따라 예술/비예술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 돼버렸기에, 미술관으로 옮겨온 박물관의 자료들이 지난날 사진이 겪었던 것만큼의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이는 한국에서 ‘사진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대형 전시들에서 주로 노출되는 문제인데, 이들 대형 사진전들이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패션사진, 보도사진 등 ‘기록으로서의 사진’의 측면이 강조되는 장르의 사진들 위주로만 전시하면서 관객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관점이 ‘왜 찍었는가’를 궁금해 하기보다는 ‘무엇을(누구를) 어떻게 찍었는가’로만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상 방식은 사실 박물관에서 그곳의 유물이나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과 큰 차이가 없다. 아카이브의 자료들이 비록 미술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작품과 관객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감상방식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그저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의 물리적 공간이동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전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들을 ‘보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대화 과정을 살았던 누군가의 인생담을 음성으로 듣고(열다섯개의 목소리, 네 사람의 목소리), 실재하지만 가상인 두 인물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박물관의 감상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민하며 자료들을 재구성해보게 한다.
전시장을 둘러보고 나면 문득 몇 십년 후, 이와 비슷한 기획을 통해 그려질 2000~2010년대의 모습은 어떠할지 상상해보게 된다. 과거에 비해 정보의 양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지만 이른바 ‘실속 없는’ 정보들만 범람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곳에는 책자와 인쇄물 대신 누군가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이나 인스타그램 앨범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사진제공 : 일민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