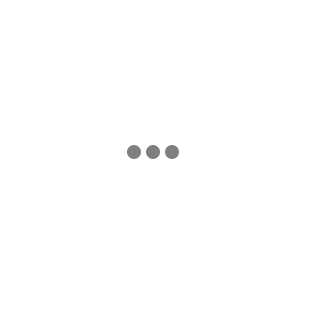다른 시공간의 이미지를 엮어내기
김익현 <Looming Shade> 산수문화, 2017.9.12 - 9.30
*와우산 타이핑 클럽에 올렸던 리뷰
글 이기원
사진은 그것이 무엇을 찍었는가와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지 또는 어떤 캡션이 붙었는지에 따라 범주와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 별 생각 없이 찍은 기념사진이 상황에 따라서는 보도사진이 되어 신문에 실리거나, 자료로서 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고, 짤방이 되어 인터넷을 떠돌게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의미의 변화 폭이 좁은, 그러니까 가장 단일한 위상으로 존재하는 사진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 평면을 복사촬영한 사진일 것이다. 복사촬영된 사진은 대체로 ‘사진’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도판’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가령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회화 작품를 복사촬영한 사진을 두고 누구도 이를 사진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회화를 찍은 도판은 철저히 회화 작품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기능하고, 문서를 찍거나 스캔한 사진 역시 문서의 ‘복사본’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한 장의 사진이 가진 의미를 깊이로 표현한다면, 복사촬영 사진은 아마 가장 얕은 깊이를 갖는 사진일 것이다. 덕분에 관객들은 그 어떤 때보다 각각의 아카이브 이미지에 집중하게 된다. 김익현이 <Looming Shade>(산수문화, 2017)를 통해 보여준 것들은 사진의 위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진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지와 연결된 사진의 깊이감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전시는 어떤 것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각각의 사진이 무엇인지 지시하는 캡션도, 전시나 작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서문도 없다. 비치된 작가의 글을 읽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작업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복사촬영한 도판에서 비롯된 정보나 작가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작업의 단초가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이다. 각각의 아카이브 이미지 역시 얼핏 서로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점에서 전시는 아주 치밀하게 ‘모호함’을 의도한다. 관객은 그 표면에서 액자 속 사진들이 꽤나 오래 전에 찍힌 자료사진이라는 점 정도를 짚어낼 수 있고, 그나마 온라인을 떠도는 짤막한 전시 소개글을 통해서 전시장의 사진들이 아카이브 이미지를 재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여전히 정보는 부족하다. 전시 말미에 발행된 도록을 살펴보더라도, 6개의 글 중 단 하나도 전시나 작품, 작가의 의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덕분에 관객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힌트를 찾으려 눈을 돌리게 된다. 가벽을 통해 생겨난 동선과 단을 만든 것은 어떤 의도인가? 전시장에 비치된 텍스트는 왜 분절돼 있는가? 도록에 실린 글들은 어째서 수직/수평이나 동상, 사진의 입자, 구글 어스와 우주 망원경을 이야기하는가?
김익현, <Looming Shade> 전시전경
이러한 물음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어렴풋이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벽으로 만들어진 다소 좁은 복도 사이에서 바라보는 사진은 오히려 충분히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사진 사이의 공간를 떠올리게 하고, 바닥면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 역시 자신이 서 있는 곳과 전시장 바닥 사이의 이격에 대해 인식하게 만든다. 전시를 둘러싼 여러 글들 역시 의도적으로 작품/전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시각/역사/기술적인 격차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캡션을 찾아볼 수 없는 전시장과는 대조적으로, 도록에서는 작품 캡션이 맨 앞 표지에 나서 있고, 이미지는 표지 뒷면에 비친 흐릿한 형태로만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 도판사진이 가장 얕은 깊이감을 가진 사진이라면, 도판 속 이미지나 문서가 갖는 깊이는 도판 사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판 사진이 지칭하는 것과 사진 속 이미지나 문서 사이에는 어떤 틈 혹은 낙차가 존재한다. <A Snowflake>(국제갤러리, 2017)에서 선보인 ‘fig.’ 연작이 그 틈을 자신의 이전 작품 ‘LINK PATH LAYER’로 메웠다면, <Looming Shade>에서 그 틈은 온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작가가 말하는 ‘이미지의 지층’에서 점프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자 비어있는 공간이 된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2014)에서 5차원의 영역에 들어간 주인공 쿠퍼가 시간축을 오가며 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관객 역시 아카이브 이미지의 각기 다른 시간대를 이동하며 작가가 구축한 이미지의 세계를 관찰하고,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나아가 각자의 시점과 방식으로 이미지의 세계를 꾸려볼 수도 있다. 이번 전시는 김익현이 그간 선보였던 작품들의 표면 아래에 누적된 레이어들을 보여주고 그 사이를 부단히 점프하고 오갔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로그파일이자 각주인 동시에, ‘Distance, Depth’(2015), ‘모두가 연결되는 미래’(2015), ‘LINK PATH LAYER’(2016), ‘휴거’(2016) 등 기존 작업 사이를 연결하는 스핀오프(Spin-off) 에피소드처럼 기능한다. 다만 스핀오프 에피소드가 본편을 관람하지 못한 시청자에겐 별다른 흥미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Looming Shade>가 의도한 빈 공간/틈/이격이 관객이 스스로 유영할 수 있는 우주(Space)가 될 것인지, 혹은 어쩌면 그저 모호한 공백(Blank)으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이미지 제공 : 산수문화
김익현, <Looming Shade> 전시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