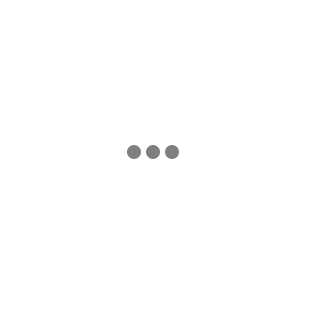데이터 벨류1(Data Value)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 무엇을, 어떻게, 왜 찍었느냐에 따라 사진도 예술작품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사진을 회화나 그래픽과 비교해 ‘사진인 것’, ‘사진이 아닌 것’, ‘사진적인 것’을 구분하려 애쓰던 때가 있었고, ‘찍는 사진’과 ‘만드는 사진’을 두고 무엇이 사진인지 논쟁을 벌였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이젠 사진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고민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사진으로 인해 예술 전체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닐까”라는 벤야민의 물음은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사진은 광학적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인 것처럼)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덕분에 사진이 투명하게 진실을 전달한다거나, 혹은 교묘하게 대상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이분법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하지만 어떤 사진들은 그들의 대상을 재현하지도, 왜곡하지도 않는 이분법의 바깥으로 옮겨왔다. 사진의 기본값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전기와 수도같은 (문명화된) 삶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됐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이미지는 액정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모든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얼마든지 변형/가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 말하자면 모니터 안에서 우리는 상상 가능한 어떤 이미지도 구현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물들이 액정화면이라는 공통된 지지체를 가진 데이터로 존재하게 되면서 각각의 고유한 형식은 무의미해졌고, 생산방식에 따른 구분 역시 모호해졌다. 회화나 드로잉처럼 직접 인간의 손을 거쳐 그려진 이미지나 필름으로 찍은 사진도 복사촬영과 스캔을 통해 픽셀로 변환되고 가공된다. 또한 액정화면을 뷰파인더 삼아 생산한 스크린샷이나 3D 툴을 활용해 구축한 이미지 역시 사진이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우리가 ‘사진’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각물의 경계는 모호해졌지만, 오히려 그 범위는 넓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자들은 피사체와 이미지와의 연결고리를 뒤틀거나 소거시켜 대상의 물질성을 탐구하고, 결이 다른 이미지들을 섞어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거나, 혹은 사진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행위 자체를 방법론 삼아 게임을 벌인다. 이들은 사진을 작업의 최종 결과물로써 대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단위로 활용한다. 이들에게 ‘무릇 사진은 어떠해야 한다’는 무거운 신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각자의 의도와 흥미,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미적인 감각에 집중할 뿐이다.
- *보스토크 9호 <뉴-플레이어 리스트 II> 특집 사이사이에 들어갔던 리드문 내지는 인서트, 책에는 무기명으로 실렸다. [본문으로]